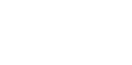미디어 속 부키 책
[프레시안]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4>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51283
- 2012-06-25 18:57
'한국경제 성격 논쟁'을 통해서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 원장,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등의
집중 비판을 받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IN> 기자의 4번째 답변입니다.
주주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 규제야말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
우리가 '재벌의 앞잡이'란 욕설까지 들으면서까지 '기업집단'을 중시하는 이유는, 소위 '경제민주화론'에서 주창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주주자본주의의 논리를 통해 기업집단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는 경우 한국 최대기업들이 오히려 더욱 국내외 주식투자자들의 단기적 금융수익 추구에 종속되어 국민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언급했듯이, 쌍용그룹 해체 이후 쌍용차의 운명이나 KT 민영화가 바로 주주자본주의적 기업재편의 대표적 사례다. 또한 우리는 금융자본주의 원리가 지금보다 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고용안정이나 복지 달성도 더 힘들어지고, 더구나 복지국가에 필수적인 공기업 및 공공인프라의 해체와 상업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다름 아니라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 현상들의 '핵심'에 금융자본주의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위 현상들은 금융자본주의에서 파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 비해 정태인 소장의 경우 금융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여러 측면 중 한 측면에 불과하며 그 폐해 역시 재벌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더구나 정태인 소장은 주주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과제에 대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조와 세계적인 금융 규제의 강화의 진행에 맞춰서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공조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다. 이렇게 기약 없는 시간표에 따라 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정태인 소장에게 있어 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교정하는 일은 별로 시급하지 않은 부차적 고려 사안이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가 옹호하는 다른 재벌규제 방안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최저임금 인상, 하청 기업의 집단 교섭권,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소비자 권리 강화 등 역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규제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