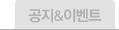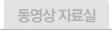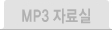"정신은 몸을 지배 못한다" 현대인의 환상을 깨는 돌직구
매년 10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소설가 필립 로스의 장편소설 `에브리맨`에는 나이듦을 둘러싼 저항과 수용의 내적 번민이 가득하다. 육체는 한없이 쇠락할지라도 주인공인 `그`는 욕망을 소거하지 않는데, 스스로 통제 불가능해져 풀이 죽은 성기, 동맥경화로 수술대에 자주 올라야만 하는 나약함은 `그`의 심연을 어둡게 만든다. 샴쌍둥이 같던 `정신과 육체`의 이별을 간접 경험하며 저 슬픈 자화상 앞에서 다들 숙연해지는 이유는 `정신이 육체를 통제한다`는 환상이 무참히 깨져서다. 어느덧 나이가 들면 `그`의 전언처럼 깨달으리라.
"나이가 드는 것은 투쟁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신은 육체를 통제할 수 없다. 멋진 체형과 적은 체중을 위해 나르시스적 개인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몸에 흔적을 새긴다. 노력으로도 이상적인 외모에 실패하면 비용을 치러 외과적 도움을 받아 의지를 넘어서려 한다. 그러나 심신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고, 저자는 일갈한다. "몸속에 있는 약간의 불량 세포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마당에 식단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몸을 통제하고자 정신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한다고, 그것이 육체에 대한 예의라고 믿어온 인류는 오래된 신화를 잃게 된다. 왜일까.
세포는 전신(全身)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 수십 억 체세포는 단일대오로 육체에 봉사하고자 존재하지 않는다. 세포는 자유롭다. 그것이 육체의 구조이다. 미국 최대의 여성 전용 헬스클럽의 소유주는 `담배는 물론 프렌치프라이엔 손도 대지 않는다`고 말한 `운동광`이었음에도 59세에 폐암으로 사망했고, 또 "나는 백세까지 살 것"이라며 건강을 확신했던 저명한 유기농 식품 옹호론자는 심장마비로 이승을 등졌다. 질병은 인간의 의지를 이탈한다. 몸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인류 암의 발병 원인 가운데 60%만이 해명됐다는 통계조차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건강 염려증이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저자는 `의료화된 삶`을 깨닫지 못한 무지에의 반성을 요구한다. 삶도, 아니 죽음마저 의료화됐다. 목에 생긴 작은 혹도 기계로 발견 가능하고 외과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선 인류는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를 배출했다. 21세기 초반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여성이 받은 갑상선암 수술의 70%는 불필요했지만 그들은 수술로 인해 무기력해졌다. 한국은 이 수치가 90%다. 뷔페식 건강검진도 현대의 의례(儀禮)로 전락했다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쇼와 유사해졌다. `아직 죽기엔 불충분한 나이`라는 환상 때문에.
의학의 대안으로서 거론된 운동도 온통 신화의 덩어리다. 전세계에 18만 개가 넘게 설치된 헬스클럽의 피트니스 문화는 통제력을 발휘할 장소라는 은유로 인류에게 다가섰다. 피트니스는 자기 통제의 신화적 공간이다. 부유한 사람만 운동을 한다는 사회계층의 지표적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건강관리는 인류의 도덕적 의무로 굳어졌다. 육체의 윤리라는 전제 하에 몸과 마음은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됐다. 몸은 늘 게으르고 욕망에만 충실하므로 자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환상이라고 말이다. 반항하는 몸은 엄숙한 정신보다 하위 존재다. 유토피아적 몸은 그야말로 허상이다.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이제 묻게 된다. 이해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죽음에의 시선을 재고해야 한다고, 저자는 일깨운다. "우리는 죽음을 삶의 비극적 중단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중단을 늦추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다. 삶이야말로 영원한 비존재 상태의 일시적 중단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경이로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짧은 기회를 얻을 뿐이다." 무병장수의 꿈은 허상이며,. 죽음을 인정하고 삶 자체에 충실하라는 제언이다. 이제 우리는 로스가 창조하고 `그`가 경험했던, 곧 다들 거치고야 말, 육체와 정신의 불화(不和)를 이해할 수 있겠다.
아마도 그것은, 삶과 죽음의 화해다.
[김유태 기자]
[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7/543060/